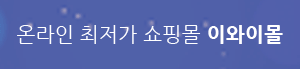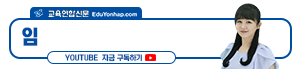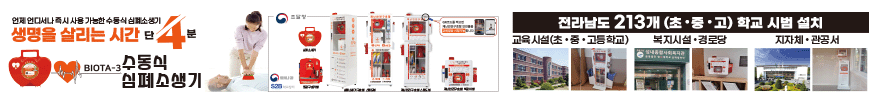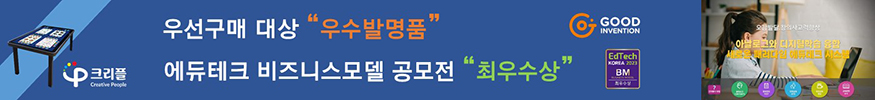'거짓말 같은 이야기' 강경수 작가와의 만남
서랍장 속에 있던 작은 기록
[교육연합신문=김현균 기자]

강경수 작가의 '거짓말 같은 이야기'는 투박하고 거칠다. 다른 그림책들과는 달리 재생지에 실린 거친 스케치, 그리고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떠올리게 하는 묵직한 말투들. 하지만 이보다 더 거칠고 묵직한 것은 그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쉽게 봤던 그림책 한 권이 아주 단단한 돌덩이가 돼 날아오는 것이다. 또 그만큼의 단단한 울림은 덤이다.
이 울림의 진원지를 찾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역에 위치한 '광화랑'에서 작가를 만나 진솔한 얘기를 나눴다.
"이 이야기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 아이들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떠올린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은 항상 제 마음 속 짐이자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이 책의 투박한 말투와 거친 그림, 또 재생지를 사용한 것은 그런 무거운 현실을 가장 잘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표현방법입니다"
배고픈 동생을 생각하며 석탄을 실어 나르는 아이,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카페트를 짜는 아이, 의료시설이 없어서 아픔을 참을 수밖에 없는 아이, 가족없이 맨홀 아래에서 외롭게 사는 아이, 총 한 자루를 쥐고 전쟁터에 뛰어든 아이 등 거짓말 같은 현실이 담겨 있는 이 얇은 책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충격과 불편함을 동시에 전해준다.
"충격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누구나 알고 있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상 언급조차 되지 않는 불편한 진실들을 말이죠. 그래서 전 오히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여줬습니다. 신기하게도 사실 그대로가 더 충격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은 각기 다른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무덤덤하게 보여준다. 책 속의 아이들은 웃지도 울지도 않는다. 작가는 그들의 실상을 과장하지도, 보는 이의 동정심을 자극하지도 않는다. 어쩌면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참혹하고 불편한 진실이 되는지도 모른다.
누구나 알고 있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동정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정작 나의 일은 아니다. 또 내 주변의 일이 더욱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나치고 마는 현실에 제동을 거는 것, 이런 불편한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어쩌면 작가가 지녔던 마음 속 짐을 덜기 위한 방법이었는지 모른다.
지구촌 곳곳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 나가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의 짐을 껴안는 느낌이라고 말하는 작가의 한 마디에 큰 책임감이 묻어 있다. 그 책임감이 수십 번씩 출판을 거절당하면서도 이 거칠고 투박한 그림들을 버릴 수 없었던 이유인지도 모른다.
"이 그림책은 6년 동안이나 제 서랍장 속에 있던 작은 기록입니다. 처음 이 그림책을 가지고 여러 출판사를 다녀봤지만 모두 음울하고 무거운 주제라면서 피하더군요"
이러한 책임감의 실천일까. 작가는 이번 책의 인세 전액을 국제어린이 후원단체인 플랜코리아에 기부하기로 했다.

▲ 강경수 작가
작가는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그림책을 계속해서 만들고 싶다고 한다. 이번 그림책도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른, 아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어린이 인권 문제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길 바라고 있다.
지구촌 어딘가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고통을 이해해보려고 할 때 우리 모두는 한뼘 더 성숙해질 것이다.
더불어 그림책 속 아이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어리지 않을까.